커뮤니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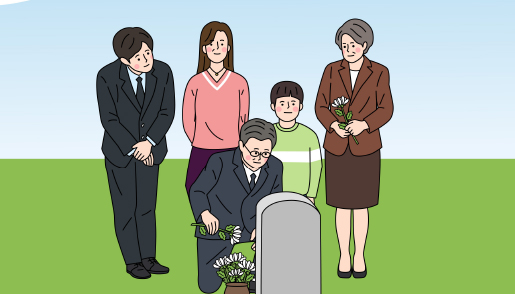
[엽편소설] 아버지와 아들
2023-06-14
문화
 문화놀이터
문화놀이터
삶의 풍경이 머무는 곳
[엽편소설] 아버지와 아들
'글. 박순철'
아들은 물론 딸까지 집에 내려 오지 말라고 엄명을 내린 소갈 씨였지만, 설날 아침이 되자 마음은 쓸쓸하기 그지없다. ‘녀석들 오지 말라 했다고 정말 내려오지 않다니,’ 혼자 구시렁거리는 소갈 씨를 바라보는 아내의 마음도 허전하기는 마찬가지다. 평소 같으면 집안이 북적북적할 것인데 절간처럼 조용하기만 하다.
소갈 씨는 혼자서라도 제사를 지낼까 하다가 그만두었다. 혼자서 제사를 지낸다는 게 서글프기도 하고 조상 뵐 면목이 없어서이기도 했다. 서둘러 주과포혜를 준비해 조상님이 계시는 선산으로 차를 운전하고 나섰다. 집에서 10여 분 걸리는, 그리 먼 거리는 아니다. 차에서 내려 걸어가는 시간도 5분이면 충분하다.
소갈 씨네 선산은 그리 넓은 면적은 아니나 토질도 좋고 양지바른 곳이어서 산소를 쓰기에는 적합한 곳이다. 멀리서 보면 꼭 공원묘지처럼 작은 봉분들이 질서정연하게 자리 잡고 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소갈 씨의 마음은 복잡하기만 하다.
자신은 종손이 아니면서도 왜 그렇게 나서서 일을 진척시켰는지 지금 생각하면 겁도 없었고 꿈같은 일이었다. 당시에는 여기저기 또는 객지에 흩어져있는 크고 작은 묘지를 한 곳으로 이장(移葬)하기 위해 집안 어른들을 찾아다니며 설득하느라 무진 애를 썼다. 쉬 허락하는 어른이 계시는가 하면 조상님의 유택(幽宅)을 옮기면 집안이 망한다며 극구 반대하는 노인도 있었다. 시대의 흐름을 역행할 수는 없었는지, 아니면 젊은 사람 뜻을 따르는 게 현명하다는 판단에서였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모두에게 허락을 얻어낼 수 있었다.

큰 벼슬을 한 조상은 안 계시지만, 7대조까지 한자리에 항렬 따라 차례로 모시고 나니 아담하고 누가 봐도 근사하다고 느낄 정도였다. 큰일을 했다는 생각에 뿌듯하기도 했다. 지금 같으면 엄두도 내지 못할 일이고 그렇게 큰일을 하지도 못했을 것이다. 그 일을 추진할 때만 해도 소갈 씨 나이 50대였고, 종중(宗中) 일을 맡아 하시던 돌아가신 아버님을 닮아서 조상을 위하는 마음이 끔찍했던 시절이었다. 처음에는 지나가는 사람들 모두 산소 잘 모셨다고, 복 받을 자손 들이란 칭찬을 아끼지 않았으나 이제는 그 말이 무색할 정도가 되었다. 자손들에게 큰 짐을 안겨준 듯하고 후세 사람들에게 과연 어떤 말을 들을까 염려되기도 했다.
옛 어른들은 서로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가묘를 써놓기도 해서 보기에도 좋지 않았고 집안 간 적잖은 마찰도 있었다. 문중이 모여서 여러 번 회의를 거친 다음에야 오늘과 같은, 일정한 크기로 봉분을 만들고 상석도 세울 수 있었다.
산소에는 이미 6촌 형님이 혼자 음식을 진열하고 있었다.
“형님 혼자 오셨어요?”
“어서 오게. 애들은 오지 말라고 했어.”
“네. 우리 애들도 내려오지 않았어요.”
“우리끼리 간단하게 잔이나 올리고 가세.”
“네. 그러지요.”
모든 일상에서 법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으려 철저히 노력하는 소갈 씨! 그래서 정부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꼭 지키는, 어떻게 보면 조금 답답한 사람같이 보이기도 하다. 그런 남편을 둔 아내의 입장은 그저 속이 터질 지경이다. 다른 집 아들네는 반질반질 윤이나는 자동차를 자랑이라도 하려는 듯 운전하고 잘 내려 왔으니 대조적이다. 이 집 아들은 아버지가 내려오지 말라는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얼씨구나 쾌재를 불렀을 것을 생각하면 조금 서운한 마음도 들었다. 이번에는 아버지의 명을 어기고 내려와도 명분도 서고 효를 실천할 기회가 될 터이지만 오지 말라고 한다고 내려오지 않은 그 아들도 아버지 못지않은 위인임이 틀림없다.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내는 음식을 이것저것 준비했지만, 아들과 며느리는 끝내 내려오지 않았다.
6촌 형님과 둘이서 잔을 올리고 일어서려는데 멀리서 걸어오는 모습들이 낯설지 않았다. 자리를 들고 앞장선 아들 내외를 따르는 두 녀석은 손자들이 분명해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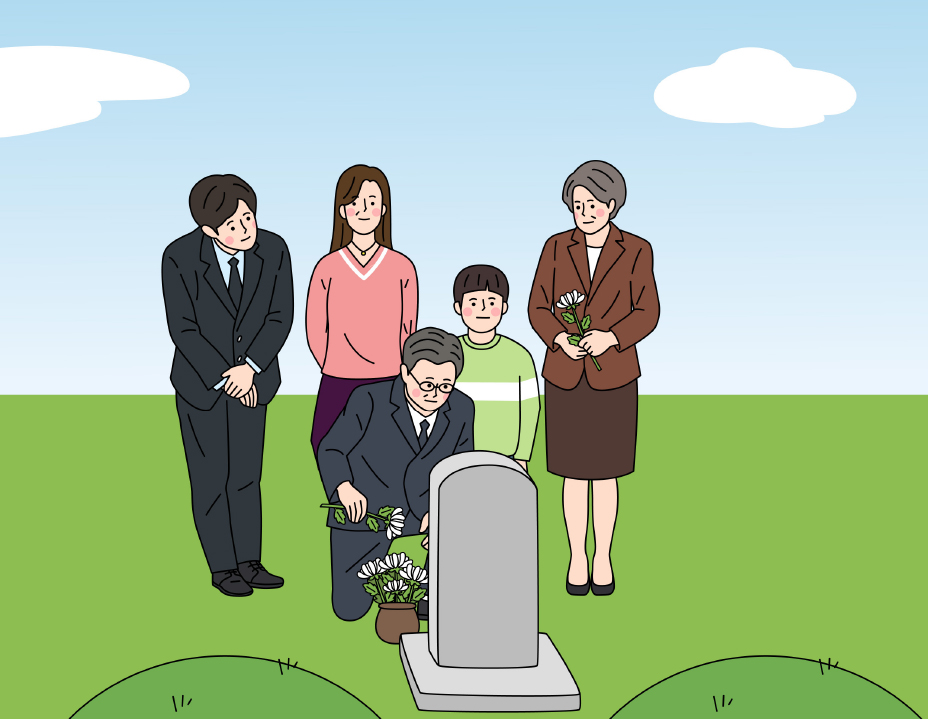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너희들 오지 말라고 했는데 어떻게 된 일이냐?”
“아무리 그래도 조상님은 찾아뵈어야 할 것 같아서요.”
아들 녀석이 머리를 긁적인다.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인 큰 손자와 3학년인 작은 손자는 잔뜩 골이 나 있다. 뭐가 마땅치 않은 듯했다.
“찬규 많이 컸구나. 왜, 할아버지네 집 오기 싫었냐?”
“아니요.”
“그럼?”
“더 놀다 오고 싶은데 아빠가 ….”
“아버님! 그냥 두세요. 자는 것 깨워서 그래요.”
며느리가 재빨리 말을 가로막으며 작은 손자의 손을 잡아끌었다. 소갈 씨가 가만히 생각해보니 이렇게 떠들고 있을 때가 아닌 것 같았다.
“안 되겠다. 다섯 사람 이상 모이지 말라고 했는데 누가 신고라도 하면 큰일이다. 형님은 저하고 먼저 내려 가십시다. 너희들은 잔 올리고 천천히 내려오거라.”
“할아버지 우리 갔던 데는 사람 엄청 많았었는데 그래도 괜찮았어요.”
“….”
내려오지 말라는 아버지의 전화를 연휴 전날 받은 것이어서 다른 것은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었다. 다만 올해는 차가 좀 덜 밀리려나 하는 생각만 하다가 정신이 번쩍 들었다. 아내에게, 두 아들에게 모처럼 자신의 위신을 세울 기회라 생각한 소갈 씨 아들은 스키장 이곳저곳에 전화를 걸었으나 모두 예약이 끝난 상태여서 어디 갈만한 곳이 마땅치 않았다.
뭐니 뭐니 해도 겨울에는 설원을 보는 것이 제일 좋을 것이란 생각에 얼씨구나 쾌재를 부르며 그믐날 꼭두새벽에 대관령으로 달려갔다. 어찌나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는지 그곳에 있다가는 꼭 코로나19에 걸릴 것만 같은 생각이 들었다. 다시 강릉 바닷가로 달려갔으나 그곳도 역시 사람들이 많기는 마찬가지였다.
아이들과 모처럼 웃고 떠들며 바닷가 백사장에서 칼바람을 맞는 것이 얼마 만인가. 모두 참으로 즐거워했다. 저녁에는 횟집으로 달려가 아이들 좋아하는 오징어순대를 먹으며 아내와 한 잔 하는 즐거움은 또 어떻고! 희희낙락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섣달그믐을 그렇게 보낸 소갈 씨 아들은 이튿날 찬란하게 밝아오는 새해 일출을 바라보다 ‘아차’ 싶었다. 오늘 쓸쓸하게 명절 아침을 맞을 부모님 생각에 심한 죄책감까지 밀려왔다. 부랴부랴 숙소로 돌아와 곤히 자는 아내와 아이들을 흔들어 깨워 쉬지 않고 고향으로 달려오기에 이르렀다. 역시 그 아버지에 그 아들이었다.
소갈 씨는 혼자서라도 제사를 지낼까 하다가 그만두었다. 혼자서 제사를 지낸다는 게 서글프기도 하고 조상 뵐 면목이 없어서이기도 했다. 서둘러 주과포혜를 준비해 조상님이 계시는 선산으로 차를 운전하고 나섰다. 집에서 10여 분 걸리는, 그리 먼 거리는 아니다. 차에서 내려 걸어가는 시간도 5분이면 충분하다.
소갈 씨네 선산은 그리 넓은 면적은 아니나 토질도 좋고 양지바른 곳이어서 산소를 쓰기에는 적합한 곳이다. 멀리서 보면 꼭 공원묘지처럼 작은 봉분들이 질서정연하게 자리 잡고 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소갈 씨의 마음은 복잡하기만 하다.
자신은 종손이 아니면서도 왜 그렇게 나서서 일을 진척시켰는지 지금 생각하면 겁도 없었고 꿈같은 일이었다. 당시에는 여기저기 또는 객지에 흩어져있는 크고 작은 묘지를 한 곳으로 이장(移葬)하기 위해 집안 어른들을 찾아다니며 설득하느라 무진 애를 썼다. 쉬 허락하는 어른이 계시는가 하면 조상님의 유택(幽宅)을 옮기면 집안이 망한다며 극구 반대하는 노인도 있었다. 시대의 흐름을 역행할 수는 없었는지, 아니면 젊은 사람 뜻을 따르는 게 현명하다는 판단에서였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모두에게 허락을 얻어낼 수 있었다.

큰 벼슬을 한 조상은 안 계시지만, 7대조까지 한자리에 항렬 따라 차례로 모시고 나니 아담하고 누가 봐도 근사하다고 느낄 정도였다. 큰일을 했다는 생각에 뿌듯하기도 했다. 지금 같으면 엄두도 내지 못할 일이고 그렇게 큰일을 하지도 못했을 것이다. 그 일을 추진할 때만 해도 소갈 씨 나이 50대였고, 종중(宗中) 일을 맡아 하시던 돌아가신 아버님을 닮아서 조상을 위하는 마음이 끔찍했던 시절이었다. 처음에는 지나가는 사람들 모두 산소 잘 모셨다고, 복 받을 자손 들이란 칭찬을 아끼지 않았으나 이제는 그 말이 무색할 정도가 되었다. 자손들에게 큰 짐을 안겨준 듯하고 후세 사람들에게 과연 어떤 말을 들을까 염려되기도 했다.
옛 어른들은 서로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가묘를 써놓기도 해서 보기에도 좋지 않았고 집안 간 적잖은 마찰도 있었다. 문중이 모여서 여러 번 회의를 거친 다음에야 오늘과 같은, 일정한 크기로 봉분을 만들고 상석도 세울 수 있었다.
산소에는 이미 6촌 형님이 혼자 음식을 진열하고 있었다.
“형님 혼자 오셨어요?”
“어서 오게. 애들은 오지 말라고 했어.”
“네. 우리 애들도 내려오지 않았어요.”
“우리끼리 간단하게 잔이나 올리고 가세.”
“네. 그러지요.”
모든 일상에서 법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으려 철저히 노력하는 소갈 씨! 그래서 정부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꼭 지키는, 어떻게 보면 조금 답답한 사람같이 보이기도 하다. 그런 남편을 둔 아내의 입장은 그저 속이 터질 지경이다. 다른 집 아들네는 반질반질 윤이나는 자동차를 자랑이라도 하려는 듯 운전하고 잘 내려 왔으니 대조적이다. 이 집 아들은 아버지가 내려오지 말라는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얼씨구나 쾌재를 불렀을 것을 생각하면 조금 서운한 마음도 들었다. 이번에는 아버지의 명을 어기고 내려와도 명분도 서고 효를 실천할 기회가 될 터이지만 오지 말라고 한다고 내려오지 않은 그 아들도 아버지 못지않은 위인임이 틀림없다.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내는 음식을 이것저것 준비했지만, 아들과 며느리는 끝내 내려오지 않았다.
6촌 형님과 둘이서 잔을 올리고 일어서려는데 멀리서 걸어오는 모습들이 낯설지 않았다. 자리를 들고 앞장선 아들 내외를 따르는 두 녀석은 손자들이 분명해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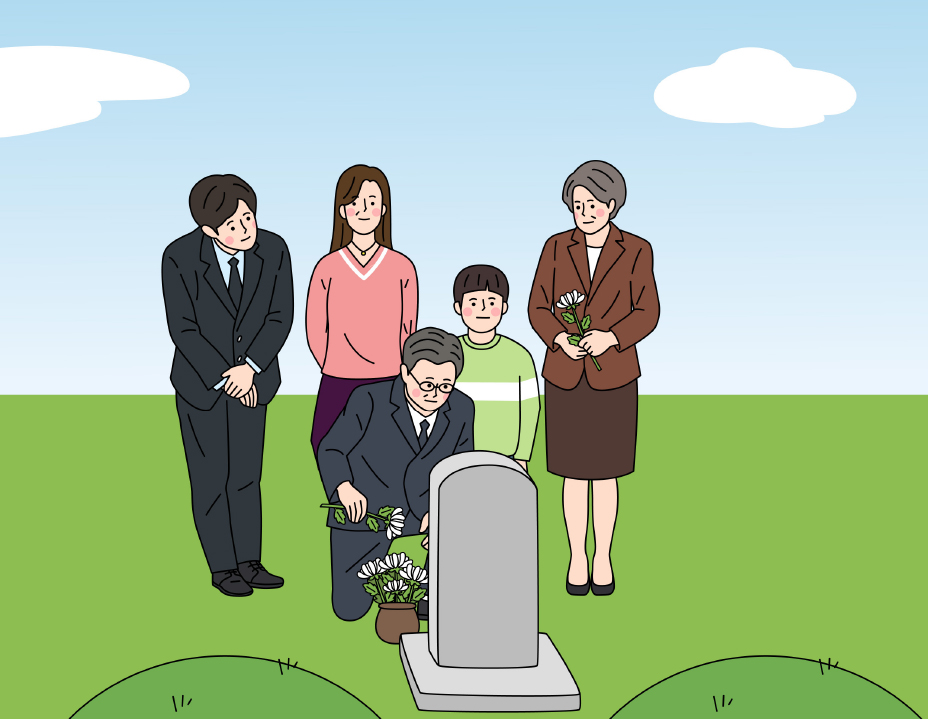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너희들 오지 말라고 했는데 어떻게 된 일이냐?”
“아무리 그래도 조상님은 찾아뵈어야 할 것 같아서요.”
아들 녀석이 머리를 긁적인다.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인 큰 손자와 3학년인 작은 손자는 잔뜩 골이 나 있다. 뭐가 마땅치 않은 듯했다.
“찬규 많이 컸구나. 왜, 할아버지네 집 오기 싫었냐?”
“아니요.”
“그럼?”
“더 놀다 오고 싶은데 아빠가 ….”
“아버님! 그냥 두세요. 자는 것 깨워서 그래요.”
며느리가 재빨리 말을 가로막으며 작은 손자의 손을 잡아끌었다. 소갈 씨가 가만히 생각해보니 이렇게 떠들고 있을 때가 아닌 것 같았다.
“안 되겠다. 다섯 사람 이상 모이지 말라고 했는데 누가 신고라도 하면 큰일이다. 형님은 저하고 먼저 내려 가십시다. 너희들은 잔 올리고 천천히 내려오거라.”
“할아버지 우리 갔던 데는 사람 엄청 많았었는데 그래도 괜찮았어요.”
“….”
내려오지 말라는 아버지의 전화를 연휴 전날 받은 것이어서 다른 것은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었다. 다만 올해는 차가 좀 덜 밀리려나 하는 생각만 하다가 정신이 번쩍 들었다. 아내에게, 두 아들에게 모처럼 자신의 위신을 세울 기회라 생각한 소갈 씨 아들은 스키장 이곳저곳에 전화를 걸었으나 모두 예약이 끝난 상태여서 어디 갈만한 곳이 마땅치 않았다.
뭐니 뭐니 해도 겨울에는 설원을 보는 것이 제일 좋을 것이란 생각에 얼씨구나 쾌재를 부르며 그믐날 꼭두새벽에 대관령으로 달려갔다. 어찌나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는지 그곳에 있다가는 꼭 코로나19에 걸릴 것만 같은 생각이 들었다. 다시 강릉 바닷가로 달려갔으나 그곳도 역시 사람들이 많기는 마찬가지였다.
아이들과 모처럼 웃고 떠들며 바닷가 백사장에서 칼바람을 맞는 것이 얼마 만인가. 모두 참으로 즐거워했다. 저녁에는 횟집으로 달려가 아이들 좋아하는 오징어순대를 먹으며 아내와 한 잔 하는 즐거움은 또 어떻고! 희희낙락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섣달그믐을 그렇게 보낸 소갈 씨 아들은 이튿날 찬란하게 밝아오는 새해 일출을 바라보다 ‘아차’ 싶었다. 오늘 쓸쓸하게 명절 아침을 맞을 부모님 생각에 심한 죄책감까지 밀려왔다. 부랴부랴 숙소로 돌아와 곤히 자는 아내와 아이들을 흔들어 깨워 쉬지 않고 고향으로 달려오기에 이르렀다. 역시 그 아버지에 그 아들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