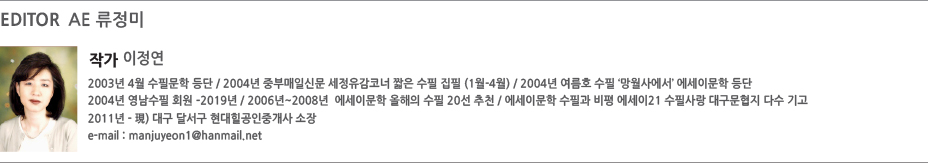커뮤니티

영암사지에서
2020-05-20
문화
 문화놀이터
문화놀이터
삶의 풍경이 머무는 곳
영암사지에서
'글. 이정연'
둥지를 찾아드는 산새의 총총한 날갯짓 그 너머로 산 그림자가 빠르게 내려왔다. 가야 하는데 저물기 전에 이 혼돈의 장소에서 일어나야 하는데 나는 문제를 풀지 못한 시험지를 껴안은 학생처럼 도무지 일어서지지 않았다. 오랜 비바람 속 석등을 바치고 있는 사자에게 소리쳐 물어본다. 도대체 누가 이 가람을 세우고는 무슨 연유로 한 점 기록도 없이 사라졌는지.......
칠흑 같은 밤 사다리를 메고 황매산에 올라 철쭉 사진 찍고 왔다고 자랑을 하자 잠시 침묵하던 친구가 거기까지 가서 영암사폐사지는 안 보고 왔느냐고 아쉬워했다. 더는 말을 아꼈지만 나는 친구가 해마다 피는 꽃 철쭉 예쁜 줄만 알지 정말 알아야 할 아름다운 것을 지나치는구나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다. 그 침묵의 여운이 오래도록 아프게 가슴에 남았으나 차일피일하다가 잊어버렸다.
얼마 전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영암사 답사기를 다시 보았다. 친구한테선 말로 전해 들었지만 이번에는 석등과 귀부 금당 터 연단에 양각된 사자조각과 큰 화강암을 통째로 깎아 만든 아름다운 돌계단 사진을 보았다. 금당 터 계단에도 조각품이 있는데 신비롭고 아름다운 여인이었다. 순간 친구의 그때 말이 다시 가슴에 메아리쳤다. 그랬구나! 이래서 나더러 가보라고 했던 거구나! 찬찬히 사진 한 장 한 장을 뜯어보았다. 여느 사찰의 조각과는 다른 묘한 느낌이 났다. 거침없으면서도 부드럽고 기품이 있으면서도 해학이 엿보이고 종교적인 엄숙함과는 다른 여유와 분방함이 느껴지는데 품위는 잃지 않았다.

영암사로 가기 전 간단히 공부했다. 영암사는 사적 131호로 지정되어 있고 쌍사자 석등, 삼층석탑, 거북조각상이 보물로 지정되어 있으며 출토된 금동여래입상의 제작 시기가 8세기경이고, 886년에 세워진 홍각선사탑비에 영암사란 사찰명이 발견되어 건립 시기는 그 이전으로 짐작할 뿐 쇠망 시기는 알 수 없다.
도착하기 전에는 영암사의 흥망성쇠가 궁금했지만, 폐사지를 둘러본 후에는 석장에 대한 맹렬한 궁금증이 일었다. 오직 망치 정과 끌로서 모든 걸 조각해야 했던 시대 이 단단한 화강암을 마치 송편 반죽 주무르듯 해학과 기품이 담긴 예술품으로 바꿔 놓은 그는 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 이미 마음에 그림을 그리고 그 그림에 따라 커다란 돌을 놓고 단숨에 쪼아간 자신감이 보인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오직 정 끝에 생각을 담아 한 번에 망치를 내려쳤을 것이다. 가람의 건축기간에는 그 어떤 상념도 조각품 아래 널브러진 지저깨비처럼 밟고 지나쳤을 것이다.
금당터 연단에 양각한 사자를 보면 그 표정에 눈을 떼지 못하게 한다. 마치 집에서 기르는 개처럼 유순한 달관의 표정에서 석장의 여유와 자신감 같은 게 느껴진다. 사찰 조각들이 대개 근엄하고 무섭고 사실적인 데 비해 어쩜 그는 이렇게 파격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조각들을 거침없이 가람의 가장 중요한 건물 금당 기단석에 새겼는가. 금당으로 오르는 계단 난간에는 곧 하늘로 날아가 버릴 것 같은 아름다운 여인상이 새겨져 있다. 후에 안 일이지만 이 조각상은 가릉빈가라고 하는데 머리는 여인이고 몸은 새로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로 울면서 극락세계의 소식을 전한다고 한다. 은해사 말사인 백흥암 수미단에 이 가릉빈가의 조각이 있다고 해서 보고 싶었는데 개방하는 날짜가 정해져 있어 못 보고 여기 영암사지에서 먼저 보게 되었다. 사방 계단석은 물론이고 눈길 닿는 곳마다 아름다운 조각이 있다. 거침없고 자유분방한 예인, 뼛속까지 천재적인 장인 그는 누구이며 어떤 사람이었는가? 석축 한 귀퉁이 기대서서 이 멋진 조각 작품의 주인공을 그려본다.
영암사에서 또 하나 눈여겨볼 것은 석축이다. 여느 사찰의 석축처럼 크고 작은 석재만을 나란히 쌓은 게 아니라 그 돌 사이에 조금 튀어나온 쐐기 같은 게 있는데 그건 여느 돌과 같은 크기가 아니라 아주 긴 것으로 석축 저 깊이까지 박혀있어 축대가 침하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무너지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한다. 축대 옆으로 쐐기돌을 자세히 보니 마치 못 머리 같은 걸 만들어 주변 석재가 밀려나지 않게 하였다. 혼을 담아 쌓은 소름 끼치는 석축이다.

나는 석등 옆에 쪼그리고 앉았다. 모산재에서 솔바람이 솨솨 불어 내린다. 춥다.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웅장하고 이렇게 치밀하고 회랑까지 갖춘 큰 가람이 왜 흥망성쇠의 기록이 한 줄도 남아있지 않은가. 안동의 어떤 작은 사찰처럼 빈대 태우려다 대웅전까지 태워 버리고 스님들은 다른 절로 뿔뿔이 흩어져 버렸는가? 그건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3차에 걸쳐 금당을 신축하지는 않았겠지! 그럼 가야사처럼 명당이 필요한 어느 권력자가 모두가 잠든 밤에 대웅전을 불태워버리고 거기다 묘를 썼는가? 그럼 여러 차례 발굴 시 그 비열한 흔적이라도 있었을 것이다. 아니면 임진왜란 당시 창졸간에 닥친 전란으로 아름다운 절은 불타버리고 후에 일본 놈이 석등마저 훔쳐 가는 것을 마을 사람들이 쫓아가 되찾아 왔다고 하는데 임진왜란이 원흉인가?
영암사지는 여러 차례 걸쳐 발굴했다. 그때마다 석탑 안 아니면 어느 주춧돌 아래 묻혀있던 건립연대라도 나올 법도 한데 감감무소식 그 흥망성쇠는 오직 수수께끼일 뿐이다. 다만 신라 말 고려 초라는 건립시기만 짐작할 뿐 아무도 아는 이가 없다.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게 궁금하다. 그러나 고스란히 이 모든 걸 지켜보았을 모산재의 눈부신 영암은 말이 없고 그 흥망성쇠의 밤낮을 지켜본 쌍사자석등도 묵묵부답이다. 합천을 말할 때 쌍사자석등을 빼면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다 하는데, 금동여래입상도 궁금한데, 별다른 장식이나 조각이 없어도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삼층석탑도 자세히 보고 싶은데 마음만 급하다. 해쓱한 낮달만 걱정스레 날 내려다보며 다음을 기약하고 그만 저물기 전에 가라고 하얗게 웃는다.
달은 말한다. 애써 알려고 하지 마라. 소식을 몰라야 그리운 법이다. 다 알고 나면 시들해지는 것, 첫사랑이 저만치 아랫마을에서 티격태격 사는 모습을 보면 애틋한 그리움도 없다. 그저 그런 듯 아닌 듯 풍문에 한마디 소식을 들었을 때 사무치는 것이다. 살면서 그런 마음 하나쯤 가슴에 묻고 있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이다. 어느 날 신문에 영암사 발굴에 관한 한 줄 소식을 본다면 너는 눈이 왕방울만 해져서 들여다볼 것이다. 그리고 잊을 만하면 다시 찾아가 날아가는 산새에게라도 떼를 써 보겠지. 아직 아무것도 아는 게 없느냐고.
칠흑 같은 밤 사다리를 메고 황매산에 올라 철쭉 사진 찍고 왔다고 자랑을 하자 잠시 침묵하던 친구가 거기까지 가서 영암사폐사지는 안 보고 왔느냐고 아쉬워했다. 더는 말을 아꼈지만 나는 친구가 해마다 피는 꽃 철쭉 예쁜 줄만 알지 정말 알아야 할 아름다운 것을 지나치는구나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다. 그 침묵의 여운이 오래도록 아프게 가슴에 남았으나 차일피일하다가 잊어버렸다.
얼마 전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영암사 답사기를 다시 보았다. 친구한테선 말로 전해 들었지만 이번에는 석등과 귀부 금당 터 연단에 양각된 사자조각과 큰 화강암을 통째로 깎아 만든 아름다운 돌계단 사진을 보았다. 금당 터 계단에도 조각품이 있는데 신비롭고 아름다운 여인이었다. 순간 친구의 그때 말이 다시 가슴에 메아리쳤다. 그랬구나! 이래서 나더러 가보라고 했던 거구나! 찬찬히 사진 한 장 한 장을 뜯어보았다. 여느 사찰의 조각과는 다른 묘한 느낌이 났다. 거침없으면서도 부드럽고 기품이 있으면서도 해학이 엿보이고 종교적인 엄숙함과는 다른 여유와 분방함이 느껴지는데 품위는 잃지 않았다.

영암사로 가기 전 간단히 공부했다. 영암사는 사적 131호로 지정되어 있고 쌍사자 석등, 삼층석탑, 거북조각상이 보물로 지정되어 있으며 출토된 금동여래입상의 제작 시기가 8세기경이고, 886년에 세워진 홍각선사탑비에 영암사란 사찰명이 발견되어 건립 시기는 그 이전으로 짐작할 뿐 쇠망 시기는 알 수 없다.
도착하기 전에는 영암사의 흥망성쇠가 궁금했지만, 폐사지를 둘러본 후에는 석장에 대한 맹렬한 궁금증이 일었다. 오직 망치 정과 끌로서 모든 걸 조각해야 했던 시대 이 단단한 화강암을 마치 송편 반죽 주무르듯 해학과 기품이 담긴 예술품으로 바꿔 놓은 그는 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 이미 마음에 그림을 그리고 그 그림에 따라 커다란 돌을 놓고 단숨에 쪼아간 자신감이 보인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오직 정 끝에 생각을 담아 한 번에 망치를 내려쳤을 것이다. 가람의 건축기간에는 그 어떤 상념도 조각품 아래 널브러진 지저깨비처럼 밟고 지나쳤을 것이다.
금당터 연단에 양각한 사자를 보면 그 표정에 눈을 떼지 못하게 한다. 마치 집에서 기르는 개처럼 유순한 달관의 표정에서 석장의 여유와 자신감 같은 게 느껴진다. 사찰 조각들이 대개 근엄하고 무섭고 사실적인 데 비해 어쩜 그는 이렇게 파격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조각들을 거침없이 가람의 가장 중요한 건물 금당 기단석에 새겼는가. 금당으로 오르는 계단 난간에는 곧 하늘로 날아가 버릴 것 같은 아름다운 여인상이 새겨져 있다. 후에 안 일이지만 이 조각상은 가릉빈가라고 하는데 머리는 여인이고 몸은 새로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로 울면서 극락세계의 소식을 전한다고 한다. 은해사 말사인 백흥암 수미단에 이 가릉빈가의 조각이 있다고 해서 보고 싶었는데 개방하는 날짜가 정해져 있어 못 보고 여기 영암사지에서 먼저 보게 되었다. 사방 계단석은 물론이고 눈길 닿는 곳마다 아름다운 조각이 있다. 거침없고 자유분방한 예인, 뼛속까지 천재적인 장인 그는 누구이며 어떤 사람이었는가? 석축 한 귀퉁이 기대서서 이 멋진 조각 작품의 주인공을 그려본다.
영암사에서 또 하나 눈여겨볼 것은 석축이다. 여느 사찰의 석축처럼 크고 작은 석재만을 나란히 쌓은 게 아니라 그 돌 사이에 조금 튀어나온 쐐기 같은 게 있는데 그건 여느 돌과 같은 크기가 아니라 아주 긴 것으로 석축 저 깊이까지 박혀있어 축대가 침하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무너지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한다. 축대 옆으로 쐐기돌을 자세히 보니 마치 못 머리 같은 걸 만들어 주변 석재가 밀려나지 않게 하였다. 혼을 담아 쌓은 소름 끼치는 석축이다.

나는 석등 옆에 쪼그리고 앉았다. 모산재에서 솔바람이 솨솨 불어 내린다. 춥다.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웅장하고 이렇게 치밀하고 회랑까지 갖춘 큰 가람이 왜 흥망성쇠의 기록이 한 줄도 남아있지 않은가. 안동의 어떤 작은 사찰처럼 빈대 태우려다 대웅전까지 태워 버리고 스님들은 다른 절로 뿔뿔이 흩어져 버렸는가? 그건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3차에 걸쳐 금당을 신축하지는 않았겠지! 그럼 가야사처럼 명당이 필요한 어느 권력자가 모두가 잠든 밤에 대웅전을 불태워버리고 거기다 묘를 썼는가? 그럼 여러 차례 발굴 시 그 비열한 흔적이라도 있었을 것이다. 아니면 임진왜란 당시 창졸간에 닥친 전란으로 아름다운 절은 불타버리고 후에 일본 놈이 석등마저 훔쳐 가는 것을 마을 사람들이 쫓아가 되찾아 왔다고 하는데 임진왜란이 원흉인가?
영암사지는 여러 차례 걸쳐 발굴했다. 그때마다 석탑 안 아니면 어느 주춧돌 아래 묻혀있던 건립연대라도 나올 법도 한데 감감무소식 그 흥망성쇠는 오직 수수께끼일 뿐이다. 다만 신라 말 고려 초라는 건립시기만 짐작할 뿐 아무도 아는 이가 없다.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게 궁금하다. 그러나 고스란히 이 모든 걸 지켜보았을 모산재의 눈부신 영암은 말이 없고 그 흥망성쇠의 밤낮을 지켜본 쌍사자석등도 묵묵부답이다. 합천을 말할 때 쌍사자석등을 빼면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다 하는데, 금동여래입상도 궁금한데, 별다른 장식이나 조각이 없어도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삼층석탑도 자세히 보고 싶은데 마음만 급하다. 해쓱한 낮달만 걱정스레 날 내려다보며 다음을 기약하고 그만 저물기 전에 가라고 하얗게 웃는다.
달은 말한다. 애써 알려고 하지 마라. 소식을 몰라야 그리운 법이다. 다 알고 나면 시들해지는 것, 첫사랑이 저만치 아랫마을에서 티격태격 사는 모습을 보면 애틋한 그리움도 없다. 그저 그런 듯 아닌 듯 풍문에 한마디 소식을 들었을 때 사무치는 것이다. 살면서 그런 마음 하나쯤 가슴에 묻고 있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이다. 어느 날 신문에 영암사 발굴에 관한 한 줄 소식을 본다면 너는 눈이 왕방울만 해져서 들여다볼 것이다. 그리고 잊을 만하면 다시 찾아가 날아가는 산새에게라도 떼를 써 보겠지. 아직 아무것도 아는 게 없느냐고.